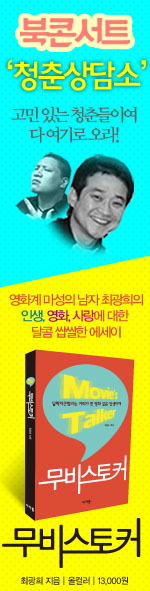한없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일컬어, 곧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법 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 만약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이 없는 걸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제 명에 못살 게 뻔하다. 이 말은 곧, 법이란 만인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고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안에서 예외나 특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법이 원칙 그대로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절대 공명무사하기만 한 것일까? 검사나 판사, 변호사도 사람인만큼, 그 안에서 적당한 타협과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법은 가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신세로 전락한다. 저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있고, 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들도 있다. 당장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여야의 해석이 서로 천양지차인 걸 보더라도, 도무지 법이란 게 뭔가, 싶어질 때가 있는 것이다.
법이 정의를 올곧이 수호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면 <모범시민> 같은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모범시민>은 형평성을 잃은 법과 그 수호자들에게 무자비한 반격을 가하며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법과 정의가 무엇이냐고 한껏 조롱하는 영화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철학적이거나 논쟁적인 작품은 아니다. <이탈리안 잡>으로 유명한 감독 F. 게리 그레이는, 한 남자의 무지막지한 연쇄 테러극과 이를 막지 못해 안달하는 수사 당국의 한판 대결을 흥미로운 범죄 스릴러의 호흡으로 펼쳐 보인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클라이드(제라드 버틀러)라는 남자의 집에 괴한이 들이닥쳐 아내와 딸이 무참히 살해된다. 범인이 잡혔지만 엉뚱한 공범이 사형을 선고받고, 진범은 풀려난다. 담당 검사 닉(제이미 폭스)이 범인과 모종의 거래를 했기 때문인데, 닉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을 아예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한다. 열받은 클라이드의 응징이 시작된다. 진범을 잔혹하게 살해한 클라이드는 순순히 붙잡혀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사법 기관 전체를 향한 닉의 복수는 지금부터다.
영화 <모범 시민>은 감옥에 갇힌 자가 연쇄적인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게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클라이드와 닉의 치열한 두뇌 게임 속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분명코 악당이지만, 이미 관객들의 감정 이입 대상으로 설정된 클라이드는 천재적인 두뇌 플레이로 자신을 홀대한 법 체계에 대한 탈법적 유린을 통해 객석에 짜릿한 전복적 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영화 <모범시민>은 법과 개인을 적대적 관계로 설정해 놓고, 법을 악의 편, 혹은 가진 자들의 편으로 바라봄으로써 클라이드의 사적 응징을 정당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클라이드처럼 모범적으로 살아온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쓰레기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모범시민>은 세상의 부조리야말로 흥미로운 이야기의 원천이라는 이치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자처한다.
그런데, 클라이드의 정체가 드러나는 후반부에 이르면, 그가 과연 말 그대로의 모범 시민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결국 '체제 수호적' 영화인 <모범 시민>은 종국에 클라이드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 역시 잊지 않는다. 그렇다. 최종 승리는 끝내 법과 제도의 몫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한판 놀아보자는 오락영화의 알리바이치고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뒤집어 생각하기’의 미덕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액션 스릴러 특유의 쾌감과 메시지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줄타기를 선보이는 <모범시민>은 너무 진중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오락영화의 얼개 안에 생각할 거리 '초큼' 가미한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로 탄생하게 됐다. 물론 당신이 생각하기를 귀찮아 하는 관객이라도 아주 불만족스럽진 않을 것이다. 제라드 버틀러와 제이미 폭스의 무게감이 꽤 큰 몫을 해낸다. 12월 10일 개봉.

3 M 興 業 (흥 UP)
영화, 음악, 방송 등 대중 문화의 틀로 세상 보기, 무해한 편견과 유익한 욕망의 해방구
by cinemAgora
by cinemAg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