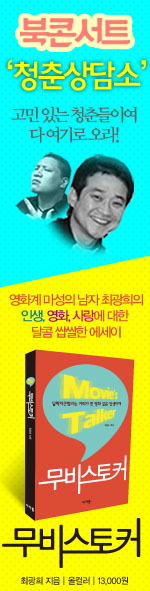'범우주적 불륜드라마'라는 제법 거창한 수식어가 달려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외계인이다. 그는 어떤 죄를 짓고 지구에 유배된 존재다. 그의 정체를 모르는 지구인 여자와 결혼해 살지만 소통이 잘 안된다. 첩보원인 아내는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고, 외계인 남편은 그와 말이 통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 선을 넘으려 한다.
줄거리를 들으면 실소할지도 모른다. 뭐냐, 이게...그냥 흔하디 흔한 불륜극 아닌가, 하고. 게다가 이런 통속적인 스토리에 외계인 설정을 끌어 들이는 게 관객들에게 얼마나 생경하게 보일지는, 비록 저주 받은 걸작 소리를 들을지언정 <지구를 지켜라>가 입증해 보인 바 있다.
<지구에서 사는 법>도 적당한 통속에 적당히 독립영화적 치기를 버무려 놓은, 그렇고 그런 영화로 보일 여지를 남기는 게 사실이다. 독립영화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는 현상의 한 사례로 보아 넘길, 뭐 그런 정도의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불륜=통속'으로 단순 치환하기 앞서, 불륜이라는 현상 자체에 좀더 흥미를 두고 본다면, <지구에서 사는 법>은 제법 곱씹을만한 구석이 적지 않은 영화다.
결혼 제도는 (적어도 성적인 면에서) 남녀간의 배타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다. 결혼 서약대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하는 게 결혼의 숙명이다. 그러데 그게 잘 안된다. 새로운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일쑤다. 한때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인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 더 멋진 남녀들이 널리고 널렸다. 게다가 결혼에 부수되는 여러 의무, 그러니까 상대방 가족에 대한 부양, 명절 챙기기, 의무적인 섹스 등에 물려갈 즈음, 나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간다. 누군가 "누구 엄마"나 "누구 아빠"가 아니라 "누구씨"라고 부른다면 가슴이 설렌다. 유흥가와 교외에 러브 호텔이 널린 건 다 이유가 있다. 불륜이라는 주제가 통속이 된 건,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불륜, 즉 윤리가 아닌 것, 또는 일탈로 통칭되는 감정을 품게 된 사람에겐 결혼 제도 자체가 감옥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가 가정을 파탄낼 생각이 없다면, 억지로 버텨야 한다. 요컨대, 그는 지구에 유배된 외계인으로 살아야 한다. 제도의 룰을 어기고, 그리하여 실격된 존재이지만 아닌 척 버티거나 파멸하거나.
이런 점에서 <지구에서 사는 법>은 어떤 사람들이 왜 불륜에 빠져 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 그것을 모든 기혼자들의 잠재적 필연으로 껴안는다. 그럼으로써 유효하지만 상투어가 된 통속을 다시금 귀 기울일만한 이야기로 부활시킨다. 배타성을 전제하기에 배태된 결혼의 또 다른 숙명과도 같은 불륜을 처연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찌할까요?" 한숨짓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영화다. 그래서 제목 <지구에서 사는 법>에서 '지구에서'를 '결혼해서'로 살짝 바꿔 놓은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9월 24일 개봉.

보도자료에 나온 안슬기 감독의 편지가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옮겨 놓는다.
To. 세상의 모든 부부들에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나의 사랑은 식었습니까?
이제와 어찌하여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옵니까?
이것이 모두 나의 잘못입니까?
사랑은 정말 사랑이고 증오는 정말 증오입니까?
혹여 우연을 뒤집어쓰고, 개인의 도덕을 방패로 삼고, 운명이라 억지 이름 붙여진
놈의 의도는 아닙니까?
아, 사랑은 간계(奸計)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깨 걸고 총을 겨눕니다.
지구에서 사는 법,
그것은 투쟁입니다.
From 안슬기.
To. 세상의 모든 부부들에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나의 사랑은 식었습니까?
이제와 어찌하여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옵니까?
이것이 모두 나의 잘못입니까?
사랑은 정말 사랑이고 증오는 정말 증오입니까?
혹여 우연을 뒤집어쓰고, 개인의 도덕을 방패로 삼고, 운명이라 억지 이름 붙여진
놈의 의도는 아닙니까?
아, 사랑은 간계(奸計)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깨 걸고 총을 겨눕니다.
지구에서 사는 법,
그것은 투쟁입니다.
From 안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