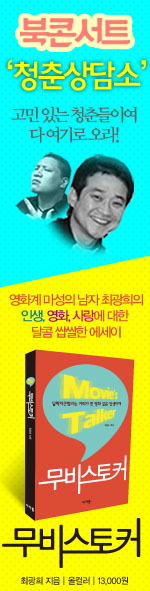영화 <해운대>가 개봉 33일만인 8월 23일,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충무로에서는 '500만 까지는 영화의 힘으로 가고, 그 이상은 현상의 힘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 말하자면, 500만 명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영화 자체의 흡인력보다 흥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후광효과가 일종의 관성 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일 것이다. 쉽게 말해 관객들 사이에서 <해운대>를 안보면 대화가 안되는 상황을 말한다. 좋든 나쁘든 일단 궁금하니, 혹은 대화에서 '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어쨌든 <해운대>가 1천만 관객을 넘기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의미를 곱씹을만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과연 이 현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역대 한국영화 가운데 1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객 동원 순이 아닌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다.
2003년
<실미도> 1108만
<태극기 휘날리며> 1174만
2005년
<왕의 남자> 1230만
2006년
<괴물> 1300만
그리고...2009년
<해운대> ?
여기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엿보게 된다. 즉, 2005년까지 1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모두 역사속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시대극이었다면, 2006년 <괴물>과 2009년의 <해운대>가 모두 현대를 배경으로, 가상의 적(한강 괴수, 메가 쓰나미)과 맞서 싸우는 이들의 사투를 다뤘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물론, 비록 1천만 관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07년 700만 관객을 돌파한 <화려한 휴가>처럼 최근까지도 시대극적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경우는 없지 않다. 그러나 2007년의 <디워>와 2008년 말의 <과속 스캔들> 등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비슷한 규모의 흥행작들이 대체로 역사에 대한 무게감을 벗어던진 SF이거나 코미디였다는 사실은 흥행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시야를 좀더 좁혀 가장 최근에 흥행에 성공한 <과속 스캔들>과 <7급 공무원>, 그리고 올 여름에 쌍끌이 흥행을 하고 있는 <해운대>와 <국가대표>만 국한해 본다면 하나의 뚜렷한 흥행 현상을 추출해낼 수 있다. 각각 음악과 첩보액션, 재난과 스포츠라는 장르 요소를 갖추고는 있지만 이들 흥행작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 같이 코미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웃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골치 아프게 과거로 날아가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곱씹거나, 혹은 지금의 부조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정색한 이야기를 보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지난 4, 5월 잇따라 개봉한 <박쥐>와 <마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흥행 성적을 낸 거나 최근 호평 속에서 흥행에 실패한 <불신지옥>의 경우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올 여름 <해운대>의 메가 히트에 성공한 CJ엔터테인먼트의 최준환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의 진단은 이렇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다 보니 관객들이 편안한 휴식 같은 영화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또한 스토리를 따라가기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영화를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영화진흥위원회 발행 'CINNO' 8월호 인터뷰 중)
그렇다고 <해운대>가 마냥 웃겨주기만 해서 흥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또 너무 단순한 분석일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선생 김봉두>부터 <웰컴 투 동막골>을 거쳐, 윤제균 감독의 전작 <1번가의 기적>까지 한국의 흥행영화가 줄곧 견지해온 그 전략, 즉 전반부엔 웃기다가 후반부엔 울리는 구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 점은 이미 500만을 돌파한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윤제균 감독의 영화만 본다면, 웃음에서 눈물로 전환되는 계기가 <1번가의 기적>의 '철거'에서 <해운대>의 '쓰나미'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애당초 1천만 관객을 내다보고 제작된만큼, <해운대>는 더욱 광범위한 관객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교한 신파 전략을 덧붙인다. 대표적으로, 주요 인물을 세대별로 배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자들을 세대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20대를 대표하는 구조대원 형식(이민기)은 사랑 앞에서 죽고, 30-40대를 대표하는 김휘(박중훈)와 이유진(엄정화)는 어린 딸 앞에서 죽는다. 60대를 대표하는 억조(송재호)는 소원했던 조카(설경구)를 구하고 희생한다. 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희생은, 각각의 세대가 갖는 로망에 부응하거나 부채감을 해소시켜주는, 일종의 심리적 보상(Reward)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영화 속 세대와 조응하는 관객들(소비자)이 구매하고자 하는 감정을 골고루 선사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쨌든 역대 다섯번째로 '천만 클럽'에 합류할 <해운대>의 흥행은 결코 이변이 아니다. 극장안에서나마 웃고 싶고 눈물 흘리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욕구에 철저하게 순응한, 기획상품의 예정된 성공이다. 우리 시대의 대중 관객이 영화로부터 감정 자판기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누군가에게는 호재로, 누군가에게는 침울한 전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