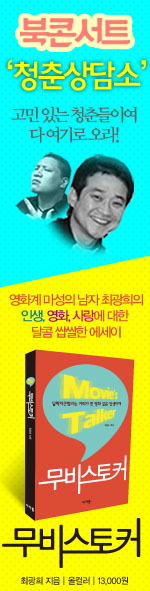영화제작사 '씨네2000'의 이춘연 대표는 입담이 좋다. 가끔 배우로도 영화에도 출연하는 그는, 자사의 영화 시사회 때마다 직접 사회를 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거북이 달린다>에 뒤이어 지난 금요일 <여고괴담 5-동반자살>의 시사회를 연 그는, 이번에도 무대에 나와 능청스러우면서도 유머러스한 입담을 과시했다.
"객석에 빈자리가 있는 걸 보니 이 영화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연 그는, "항간에는 더 세고 더 잔인하며 더 무섭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슬픈 정서를 담아내고 싶다"며 이 장수 시리즈를 1편부터 줄곧 뚝심있게 이어온 프로듀서로서의 변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는 참석한 기자들에게 "제발, <여고괴담> 무섭지 않다는 제목만은 피해달라"고 농담을 섞어 신신당부했다.
그의 당부를 가이드라인 삼아, 나는 <여고괴담 5-동반자살>이 무섭거나 혹은 무섭지 않거나, 하는 기준에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여, 이 후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의 감상을 늘어 놓지는 않을 생각이다. 실상 1998년에 박기형 감독이 연출한 1편과 김태용, 민규동이라는 걸출한 신인 감독의 출현을 알린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등의 작품은 단순한 공포영화의 틀을 넘어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가슴 저린 슬픔을 탁월하게 담아냈다고 봤기에 오히려 그의 가이드라인은 <여고괴담> 시리즈의 미덕을 상기시키는 요소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난 뒤에도 이춘연 프로듀서가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는 그 어떤 슬픔의 정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여고 2학년의 시선으로 봐달라"는 이종용 감독의 당부를 따르기 어려워서였을까.

영화에 대한 감상은 영화 그 자체의 만듦새 뿐 아니라 관객이 처한 주관적 상태와 세계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아무리 걸작도 내 취향이 아니면 졸작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여고생의 시선을 채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왠지 억울하다. 그러기엔 영화적인 허점이 너무 많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여고괴담 5-동반 자살>에서 슬픔의 정서를 이루는 요소를 찾아낸다면, 입시와 성적에 대한 중압감, 왕따, 가정 폭력, 이루지 못한 우정 등일 것이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기에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피상적으로 전시될 뿐이다. 그러니까 괴담 영화, 또는 전통적인 한국의 귀신 영화들이 자주 사용하는 원한의 플롯이 공포를 강조하기 위한 매개 요인으로만 기능할 뿐 밑바닥에 도저하게 흐르며 관객의 폐부에 와닿는 정서의 아우라에 도달하진 못한다.
영화는 대신, 장르적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 미스터리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영화 초반, 세 여학생들이 자살 동맹을 맺는 장면에 이어 그 자리에 없었던 또 다른 여학생 언주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활관 옥상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의 긴장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다.
셋다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말은 안한다.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들은 다 알지만 오로지 언주의 동생과 관객들만 모르는 것이다. 영화는 영문을 아는 이들의 입을 단속함으로써 이 미스터리를 꽁꽁 숨기는 가운데, 살아 남은 이들을 응징하기 위한, 혹은 살아 남은 이들이 지닌 죄책감의 현시로서의 원혼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라는 상투적 씬들을 상투적으로 삽입하기 시작한다. 주요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사건은 헐겁게 이어지다가 예정된 순간에 예정된 갈등과 파국으로 치닫는다.
무엇보다 영화적 표현력이라는 측면에서, 전작들과 다른 차원의 공포의 순간이나 정서의 전달 방식을 찾아내려는 감독의 연출가적 야심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게 없다. 귀신이 나타나는 장면에서의 화면 연출과 음향 효과도 비슷하고, 놀라 자빠지는 리액션의 동선도 전작들의 답습이다. 마치 보너스를 얹어주듯 나오는 마지막 반전은 뜬금 없다.
사실 시리즈의 백미랄 수 있는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뒤에 나온 속편들에선 이춘연 프로듀서가 강조한 슬픔의 정서가 제대로 포획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3편부터는 차라리 만들어지지 않음만 못했다는 혹평이 잇따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국영화계 내에서 5편까지 나오는 장수 시리즈 하나쯤 있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시리즈의 역사에 신인 여배우들의 등용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엔 연출의 신선도와 슬픔의 정서가 갈수록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듀서가 절감해 주기를 바란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의 여고생들은 여전히 세상이 무섭고 슬플 터인데 말이다.
6월 18일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