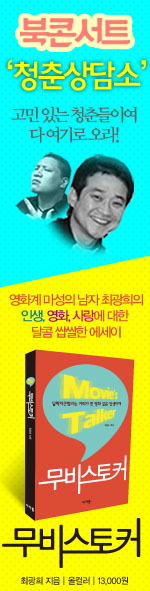마지막 키커의 발을 떠난 공이 골대를 외면하는 순간, 찰라의 절망 속에 빠져든 선수들은 아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순간, 나는 거리에서 다른 시민들과 TV 모니터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4강 진출의 영웅 이운재가 다 잡은 볼을 알까기한 순간부터 불안의 웅성거림이 높아졌다. 그리고 패배가 확정되자, 시민들은 순식간에 가던 길을 가기 시작하며 한마디씩 했다. "운으로 잡은 4강, 운으로 놓치는군." 아쉬움은 순식간에 사그러 드는 분위기였다.
사실 그 놈의 얄궂은 승부차기는 '비김'을 인정할 수 없는 토너먼트 승부의 룰이 강요한 억지나 다름 없다. 대관절, 다섯번 차고 다섯번 막아서, 실력을 판가름하고 승패를 나눈다는 게 말이라도 되는 이치인가. 축구가 무슨 '섯다'도 아니고. 러시안 룰렛도 아닌 터에 말이다. 그래도 모두들 그 억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든 승부를 가려 내야 결승이라는 더 큰 이벤트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순간, 가당치 않게도, 23명의 한국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척박한 땅에 억류돼 있는 잔인한 현실이 떠올랐다. 그 비극조차 저 승부차기 장면처럼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오로지 운에만 맡겨야 하는 한 편의 우연 게임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치스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뉴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억류된 23명의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선교단을 인솔한 목사가 첫 희생자였다.
오늘 시사회에서 영화 <리턴>을 보는데, 자꾸 뜬금없이 영화의 내용이 그쪽으로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릴 적 수술대 위에서 근육만 마취되고 의식은 선명하게 깨어 있게 되는 바람에, 의사들이 메스로 자신의 가슴을 열어 젖힐 때의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한 10살 소년, 최면으로 봉인된 그 끔찍한 기억이 25년만에 되살아나 관련된 자들에게, 그 자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수의 향연을 펼친다는 얘기다. 이른바 '수술중 각성'이라는 낯선 의학용어가 모티브다.
이 경우에 과연 죄는 의사의 몫인가. 수술중 각성이라는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의학적 현상이 죄인가. 집도의에게 잘못이 있다 한들, 그 가족과 후손들은 또 무엇이 죄인가.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지능적 연쇄살인범은, 그러나 누군가에게 죄를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는 다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온 자신의 고통을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줄 뿐이다. 영문도 모르는 피해자들은, 그 난데 없는 복수극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의도하지 않은 상처가 의도조차 몰랐던 이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하러 간 23명의 한국인은 탈레반의 원수였던가. 그들을 붙잡아 놓고 죄수를 내놓으라고, 안그러면 다 죽이겠다고 윽박지르는 탈레반은 우리의 원수였던가. 그 척박한 땅에 깊게 패인 상처가 분노의 칼날이 되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우리의 폐부를 깊이 찌른다. 한국축구의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바라며 흥분하던 그 시각, 탈레반은 한국 목사의 몸에 10방의 총알을 박았다.
영화 <리턴>은 여름에 개봉하는 스릴러 답게, 수술중 각성이라는 경악스러운 공포를 객석에 전달하려 애쓰는 한편, 주요 등장 인물 가운데 누가 범인인지 알아맞춰 보라는 흥미로운 추리 게임을 선사한다. 이게 이 영화의 주된 의도이자 흥행 포인트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이 영화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원수됨을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의 메타포처럼 느껴진다.
의식은 깨어 있어 몸이 난도질되는 걸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수술중 각성의 상태로,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젠장, 나를 제발 내버려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강요된 침묵의 와중에, 우리의 바람과 전혀 상관 없이 저 세력과 이 세력이 승부차기를 펼친다. 엉뚱한 사람의 몸에 총알을 박아 순교자로 만든다.
어떤 공포 영화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거대한 현실의 공포를 압도할 수 없다. 이런 데 생각이 이르면, 한가로이 가공의 공포를 즐기고 앉아 있는 내 자신이 한 없이 무기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