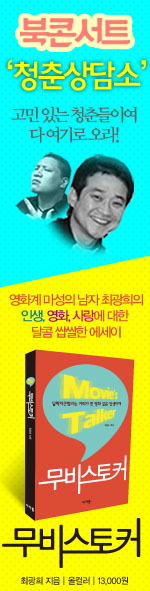가끔, 이른바 흥행 감독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질 때가 있다.
"감독님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나요? 진정으로 그 영화에 하고자 했던 말을 다 담으셨나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소위 상업영화가 태어나기까지 감독은 여러 복병들과 싸워야 한다. 가장 먼저 제작자를 매료시키는 시나리오를 써야 하고, 그 시나리오가 배우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톱 배우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선 까짓 장면 수정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눈에 띄어야 한다. '통계'를 믿는 그들이 '흥행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얘기 안에 끌어 들여야 한다. 그러다보면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 애초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나브로 엉뚱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기 십상이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저 찬란한 입봉(일본어 '잇뽕'이 영상업계에서 변형돼 사용되는 말로 '데뷔'를 말한다)을 위해 이를 악문다.
단순화해보면, 감독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더 많은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실체 없는, 그러나 강력한 견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여기저기서 간섭과 견제, 태클이 돌아온다. 한국영화계에 그런 태클들에도 끄떡않을 수 있는 이는, 내가 알기로 메이저 배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몇몇 스타 감독들 뿐이다.
영화 한 편 소개한다는 게 서론이 길었다. 11월 18일 개봉을 앞둔 신수원 감독의 <레인보우>에는 그런 감독이 나온다. 정확히 말해 감독은 아니다. 감독 지망생이자 고교생 아들을 둔 엄마. 잘 다니던 직장 떼려 치우고 영화 감독 입봉의 야심을 품었건만, 막상 쓴 시나리오는 몇 년 째 표류하고 있고 그나마 새로 쓴 시나리오마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신세. 언제는 "감독님 쓰고 싶은데로 쓰세요" 했던 프로듀서는,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업성이 부족해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다"고 발을 뺀다. 도대체 뭐가 정답이란 말이냐.
로버트 맥기의 시나리오 작법 교과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를 툭 받아 안고 이 아줌마 감독 지망생은 고뇌에 빠진다. 사건은 10분 안에 시작돼야 하고, 캐릭터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모든 행동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젠장, 이유가 없는 행동도 있다고! 왜 모든 영화가 공식에 맞춰야 하느냐고!
실제 신수원 감독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한 <레인보우>는 극중 인물의 성격 그대로, 흔히 알려진 매력적인 이야기의 공식을 거부한다. 중심 사건이랄 게 없고, 캐릭터들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과하지 않으며, 별 이유 없는 행동을 일삼는다. 그렇게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실은 진짜 삶이라는 듯, 가공의 장식물을 최대한 배제하려 든다. 그렇게 해서 비주류 영화의 소박함만 남았다면 서운했겠지만, <레인보우>는 오히려 그 안에서 묵직한 진정성, 삶에 대한 보편적 성찰을 한 되박 건져 올린다.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구요." 억울한 듯 내뱉는 영화 속 '루저' 감독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 영화의 신수원 감독은, 캐릭터도 아니고 주인공도, 조연도 아닌, 저 보잘 것 없는 단역 가운데 '행인 3'의 이야기, 실은 우리 모두이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저 스쳐지나는 배경에 불과한,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어쩌면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린 그 순간, 그는 천만 흥행 감독보다 백 배는 더 행복할 것이 틀림 없다. 적어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엄마, 루저가 뭐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지.
그럼 위너는?
얻을 게 없는 사람.
그럼 엄마는?
행인...걸어가는 사람.
-영화 <레인보우> 중에서
덧붙임) <레인보우>는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음악 영화이기도 하며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다.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도 감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영화가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다.
트위터: @cinemagora

3 M 興 業 (흥 UP)
영화, 음악, 방송 등 대중 문화의 틀로 세상 보기, 무해한 편견과 유익한 욕망의 해방구
by cinemAgora
by cinemAgora